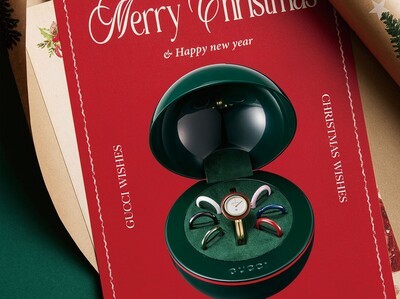잘생긴 다이얼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이 시계의 가장 큰 무기는 헤리티지도, 무브먼트도, 브레이슬릿도 아닐지 모르겠다고. 태그호이어의 까레라 크로노그래프 판다를 차보며 느낀 것.

태그호이어 까레라 크로노그래프
레퍼런스 CBS2216.BA0048
케이스 지름 39mm
러그 너비 20.7mm
두께 13.9mm
케이스 소재 스테인리스 스틸
방수 100m
브레이슬릿 스테인리스 스틸
무브먼트 TH20-00
기능 시·분·초, 날짜, 크로노그래프
파워 리저브 80시간
구동 방식 오토매틱
가격 1076만원
태그호이어 영문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 노신사의 사진이 떠오른다. 사진 위에는 이런 문구가 자랑스럽게 걸려 있다. ‘A Legacy in Time(시간 속의 유산).’ 남자는 잘 다린 셔츠에 라펠이 넓은 블랙 재킷을 걸치고 있다. 적포도주 빛깔이 도는 타이, 여기에 컬러를 맞춘 행커치프까지. 남자는 한껏 세련된 인상을 풍긴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너그러운 미소를 띠고 있다. 마우스 스크롤을 내리자 곧이어 이런 문장이 뒤따른다. ‘그의 여정은 중요한 시대를 통과하며 워치메이킹계에 사라지지 않을 유산을 남겼다.’ 남자의 이름은 잭 호이어. 태그호이어 창립자 에드워드 호이어의 증손자이자, 브랜드의 황금기를 견인한 주인공이다.
사진 속 잭 호이어는 왼쪽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다. 시계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면, 호이어가 찬 시계가 무엇인지 알아차리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까레라다. 잭 호이어는 태그호이어의 많은 시계 중에서도 왜 하필 까레라를 찼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잭 호이어가 남긴 일생일대의 대표작이기 때문이다. 까레라는 왜 특별할까. 대부분의 워치 아이콘들이 그렇듯 까레라 역시 그 이름에 출생의 비밀이 담겨 있다.
까레라는 멕시코의 카레이싱 대회 ‘까레라 파나메리카나’에서 따온 이름이다. 까레라 파나메리카는 7일 동안 험준한 코스를 3000km나 달리는 대회였다. 워낙 주행 코스가 위험한 탓에 한 멕시코 언론은 이 경기를 ‘범죄’로 취급할 정도였지만, 이곳에서 승리한 드라이버는 전설이 됐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잭 호이어는 곧장 모터스포츠에 매료되었지만, 레이서가 되기보다 자신의 재능을 살리는 쪽을 선택했다. 그렇게 1963년, 호이어의 까레라 크로노그래프가 처음 출시됐다.

지금 보고 있는 까레라 크로노그래프는 1963년 까레라를 계승한 시계다. 이 시계가 더욱 특별한 건 컬러 때문이다. ‘판다’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이 모델은 1960년대 출시된 호이어 7753 SN의 디자인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여기서 SN은 ‘Silver’와 ‘Noir’을 뜻한다. 이름 그대로 은색과 검은색 조합이 특징으로, 그 모습이 판다 얼굴을 닮아 지금의 별칭으로 불린다. 신형 까레라 크로노그래프는 2024 워치스 앤 원더스에서 새롭게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올해는 새 브레이슬릿을 적용해 다시 한번 눈길을 끌고 있다. 에디터가 이 시계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하나였다. 과연 1076만원을 주고 살 만한 시계일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39mm 케이스 안에 오밀조밀하게 구성한 다이얼이다. 은색 다이얼은 선레이 브러싱을 적용해 빛을 부드럽게 반사한다. 반면 3·9시 방향에 위치한 크로노그래프 카운터는 색깔도 질감도 다르다. 카운터에는 여러 개의 원이 촘촘히 새겨졌다. 여기에 빨간색 핸즈를 올려 자동차 계기반을 보는 듯한 인상도 풍긴다. 균형감 있는 다이얼은 그 자체로 눈을 즐겁게 하지만, 강한 햇빛 아래서도 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만족스럽다.
시계 안에는 TH20-00 칼리버를 탑재했다. 파워 리저브는 80시간으로 넉넉한 편. 시계 뒷면에는 투명한 사파이어 글라스를 얹어 시시각각 돌아가는 로터를 확인할 수 있다. 방수 성능은 수심 100m로 맞춰 일상생활에서 편의성까지 갖췄다. 시계를 손목에 올렸을 때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은 착용감이다. 중앙에 배치된 작은 링크들은 직선이 아닌 곡선형으로 만들어 손목 위에서 부드럽게 흐른다. 태그호이어는 새로운 브레이슬릿에 ‘비즈 오브 라이스(Beads of Rice)’라는 이름을 붙였다. 촘촘하게 연결한 작은 링크들이 쌀알 모양 같다는 뜻. 이 역시 1960년대 디자인을 차용한 것으로, 호이어 시절의 디자인을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만족스러울 요소다.
시계와 자동차에는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는 오감으로 경험할 때만 그 진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설득됐다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뒤늦게 고백하자면 크로노그래프 시계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쓰지도 않을 복잡한 기능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매일같이 꽉 막힌 강남대로에서 정속 주행조차 못하는 현대인에게 크로노그래프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하지만 하루 동안 손목 위의 까레라를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잘생긴 시계 앞에서는 장사가 없구나. 구구절절 잭 호이어의 업적과 까레라의 탄생기를 읊었지만, 어쩌면 이조차도 큰 의미는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생겼으니까. 시계를 반납할 즈음에는 1076만원이라는 숫자가 한결 가볍게 느껴졌다.
Editor 주현욱
Photographer 이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