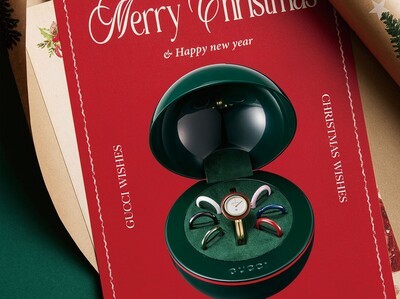팰리세이드는 변화를 이끌었다. 아니, 계기가 됐다. 한국에도 대형 SUV가 잘 팔릴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신형 팰리세이드는 계기를 넘어 확신을 준다. 대형 SUV는 매력적이라고. 작은 차 좋아하는데도 타보니 탐스러웠다.
미래적으로 보이게 한다.

엔진 I4 2.5 터보 | 최고출력 281마력 | 최대토크 43.0kg·m
복합연비 9.7km/L | 크기 5060/1980/1805mm(전장/전폭/전고) | 가격 4383만원부터
거대한 차들이 늘어났다. 원래 차는 점점 커져왔다. 세대 바뀔 때마다 덩치가 달라졌다. 그럼에도 심정적 선은 있었다. 대형보다 준대형 정도가 큰 차의 기준이었다. 그 이상은 너무 크지 않아? 하는 심적 한계. 그 기준이 깨진 건 6년 전이었다. 현대차가 팰리세이드를 선보이고 나서. 더 큰 차를 원하는 마음은 원래 있었는지 모른다. 그 마음을 실제 소유로 이끌 방아쇠가 필요했을 뿐이었다. 팰리세이드는 방아쇠를 당겼다. 접근성 좋은 대형 SUV. 반응은 폭발했고, 인식이 달라졌다. 그 이후로 수입차 브랜드에서도 풀사이즈 SUV를 여럿 선보였다. 생각보다 한국인은 큰 차를 원했음을 확인했다. 시작은 팰리세이드였다.
팰리세이드는 2세대로 거듭났다. 1세대는 인식을 바꿨다. 2세대는 완성도를 높였다. 덩치를 더 키우고, 안팎을 쇄신했다. 주행성도 한층 신경 썼다. 변화 폭이 크다. 성공한 차종인데도 많은 부분 달라졌다. 원래 현대차의 세대 변경은 전 세대를 지운다. 모든 차는 신형이 좋다. 현대차는 더 좋다. 물론 가끔 방향성에서 혼선을 빚긴 하지만. 팰리세이드 2세대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 누가 봐도 신형 팰리세이드의 손을 들어줄 정도다. 그사이 대형 SUV 선호도도 더욱 단단해졌다. 신형 팰리세이드는 그 흐름을 확실히 이어간다. 출시하고 공개한 자료만으로도 확연히 다가온다. 디자인부터 크기, 옵션까지. 가장의 소유욕을 자극한다.
실제로 본 신형 팰리세이드는 압도적이었다. 사진보다 실물에서 느끼는 위압감이 더 크다. 왜 아니겠는가. 전장이 무려 65mm 늘어났다. 이제 5m가 넘는다. 전고도 15mm 높아졌다. 자동차는 10mm 차이가 시각적으로 꽤 크다. 수치 이상의 디자인 효과도 있다. 신형 팰리세이드는 자 대고 그린 듯 반듯하다. 곡선으로 모서리를 마무리했을 뿐이다. 주간주행등도 블록처럼 반듯하게 쌓았다. 앞도 뒤도 직선이 도드라진다. 화려한 곡선 대신 듬직한 직선으로 차를 그렸다. 굴곡진 선이 없으니 한 덩어리로 보인다. 덩치를 더욱 압도적으로 보이게 하는 요소다. 그렇다고 외관이 지루하진 않다. 주간주행등으로 미래 감각도 입혔다. 최근 현대 디자인 흐름이다. 단순하게, 하지만 미래적으로. 그랜저가 그랬고, 산타페도 그랬다. 신형 팰리세이드는 덩치를 강조하면서 미래적으로 나아간다. 전 세대보다 더 많은 사람이 선호할 디자인이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신형 팰리세이드 디자인은 보편적이자 미래적이면서, 보다 웅장하다. 역시 신형이 구형보다 낫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플라스틱 표면을 처리하는 데도 공들였다.
한눈에 들어오는 강렬함보다 오래 사용할수록 흐뭇해질 질감이다.
실내로 들어서면 차분하다. 외관의 간결함을 실내로 잇는다. 대시보드는 응접실의 테이블처럼 고상하다. 라운드 디자인으로 부드러움을 강조한다. 화려하게 뽐내기보다 편안함을 조성하는 방향성이다. 소재가 주는 감흥도 차분하다.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니기에 고급 소재로 둘러싸진 않았다. 그럼에도 질감이 꽤 고급스럽다. 플라스틱 표면을 처리하는 데도 공들였다. 한눈에 들어오는 강렬함보다 오래 사용할수록 흐뭇해질 질감이다. 디테일에 신경 썼다는 얘기다. 오랜만에 현대차를 접하는 사람이라면 놀랄 수준이다.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다. 질감보다 시각적 자극에 집중했다. 과한 스타일을 뽐내듯 입은 느낌이었다. 어울릴 리 없었다. 이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아차렸다. 요소가 아닌 방향성. 잘 찾았다.
실내에서 누릴 편의 장치는 기함답다. 원래 이 부분은 현대차가 잘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한마디로 옵션이 좋다. 특히 시승차는 최상위인 캘리그래피 트림이다. ‘오, 이것도 돼?’ 하는 것들이 차고 넘친다. 특히 시트에 신경 썼다. 3열까지 전동으로 조정한다. 접거나 펴거나 앞뒤로 움직이거나. 2열 시트는 통풍 기능은 물론, 마사지 기능까지 있다. 심지어 잘 안 쓰는 3열에도 열선 기능이 있다. 운전석 시트는 운전자 허리도 염려해준다. 주행 중 때 되면 시트에 변화를 줘 통증을 완화해준다. 신형 팰리세이드는 덩치만 큰 게 아니다. 덩치를 채운 옵션도 두둑하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야 국내에선 최고로 꼽힌다.
안팎 보며 흡족해진 기분으로 시승을 시작했다. 시승차는 2.5 터보 가솔린 모델이다. 최고출력 281마력, 최대토크 43.0kg·m를 발휘한다. 덩치가 크지만 굼뜰 출력은 아니다. 복합연비는 리터당 9.7km 달린다. 연비가 아쉽다면 하이브리드 모델로 가면 된다. 출력도 더 높다. 대신 그만큼 가격도 높다. 같은 트림 기준 터보 가솔린 모델보다 600만원 정도 더 비싸다.

도심부터 교외까지 달리면서 명확히 느낀 점이 있다. 승차감이 꽤 진중하고 안락하다. 물론 핸들링은 가볍고, 차체 움직임도 어느 정도 있다. 덩치가 크니 말끔하게 움직임을 다잡긴 힘들다. 이런 점을 감안해도 기본적인 주행 감각이 고급스럽게 다가온다. 이유가 있다. 현대차 SUV 최초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장착했기 때문이다. 노면을 미리 파악해 서스펜션을 조절한다. 급격한 움직임보다 일상적인 주행에서 빛을 발한다. 정속으로 달리면 요트의 항해 같은 근사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덩치와 하체가 만들어낸 절묘한 감각이다.
신형 팰리세이드는 기본적으로 안락함을 지향한다. 당연한 말이다. 패밀리 카의 기함 격이니까. 게다가 연비도 고려해야 한다. 재빨리 단수를 높여 엔진 회전수를 낮춘다. 급가속 때 한 박자 늦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일상에선 느긋한 반응에 아쉬울 건 없다. 대형 SUV를 밀어붙이고 싶은 욕망이 든다면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된다. 제법 반응이 날카로워지면서 차체를 밀어붙인다. 이때 시트 양쪽이 불어나 운전자의 허리도 잡아준다. 스포츠성을 아예 거세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달릴 땐 달린다. 달릴 수 있다.
신형 팰리세이드를 타면서 레인지로버가 떠올랐다면 과장일까. 물론 레인지로버의 고급스러움과 등가 비교는 무리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가격은 확실한 선을 긋는다. 알면서도 레인지로버가 떠올랐다. 거대한, 그러면서 고급스러움을 더한 기함 SUV를 타는 포만감 말이다. 신형 팰리세이드는 국산 차로서 이런 감흥을 느끼게 한다. 가격 생각하면 흐뭇할 수밖에 없다.
가장 멀리 가는 전기차
기아 EV4는 1회 충전 시 533km를 달린다. 현대차 그룹 차종 중 최고다.

기아가 EV4를 출시했다. 이름 보면 알 수 있듯 전기차다. 게다가 접근성 좋은 크기의 세단형 전기차다. 많이 팔릴 모델이란 뜻이다. 보통 이럴 때 합리성을 강조한다. EV4의 합리성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대표한다. 롱레인지 모델 기준 81.4kWh 배터리를 탑재했다. 인증 받은 주행거리는 533km다. 현대차 그룹 차종 중 최고 수치다. 언제나 그렇듯 실제로는 더 달릴 수 있다. 시승 행사에서 전비 콘테스트를 이벤트로 연 이유다. 가격과 성능을 고려하면 출중한 합리성이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독보적이지만, EV4의 매력은 그것만이 아니다. 체급을 뛰어넘는 안락함이 있다. 보통 합리성을 강조하면 다른 건 뒤로 밀린다. 타협해야 할 요소니까. EV4는 합리적인데도 감도가 좋다. 시승 코스를 달리며 중형 혹은 대형 세단 타는 감각이 이어졌다. 도로의 요철을 지날 때,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진중하다. 출력도 쾌적하다. 가속페달을 깊게 밟으면 펀치력도 상당하다. 각종 편의 사양도 아쉬울 게 없다. EV4의 경쟁 모델은 형태가 다른 EV3뿐이다. 안락함은 오히려 더 뛰어나다. 아쉬움이라면 전위적 디자인뿐이다. 그만큼 구성이 뛰어나다. EV3에 이어 연타석 홈런을 기대해도 좋다.
Editor 김종훈
Photographer 신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