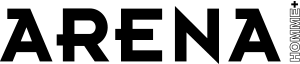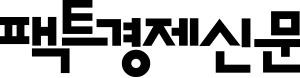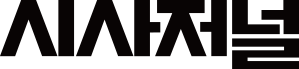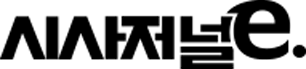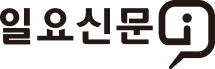연이은 바쁜 일정으로, 비엔나에 도착하려면 몇 시간의 비행이 필요하단 사실보다 그 시간에 아무런 방해 없이 푹 잘 수 있다는 기대 하나만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영화 <트루먼 쇼>처럼 모든 사람이 걱정, 근심 없는 표정으로 길거리를 걷고 그 길거리 위엔 쓰레기 하나 없는 아름다운 도시라는 것만을 들은 채. 처음 발을 디딘 곳은 프라터 놀이공원이었다. 영화 <비포 선라이즈>를 몇 번이고 볼 만큼 제시와 셀린의 사랑을 흠모했기에 비엔나에 간다면 가장 먼저 들르고 싶던 장소였다. 짐을 숙소에 두자마자 무턱대고 찾아간 그곳은 내게 비엔나에 대한 낭만적인 첫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프라터 놀이공원 입구에는 커다란 나무로 인해 푸른 신록이 드리워진 드넓은 잔디가 펼쳐졌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여유로운 한낮을 누리고 있었다.
비엔나 하면 예술을 빼놓을 수 없다. 구스타프 클림트와 에곤 실레, 설명이 필요 없는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화가들. 이 도시가 추구하는 예술적 태도와 유산 보존의 방식은 그 자체로 미학이었다. 나는 여행이든 출장이든, 그 도시의 역사적 맥락부터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비엔나 박물관은 꽤 인상 깊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오롯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본인들의 리듬에 맞춰나가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
로마 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비엔나가 왜 지금의 도시가 되었는지 자연스레 그려졌다. 그 안엔 구스타프 클림트와 에곤 실레의 흔적도 담겨 있었다. 비엔나에는 ‘여긴 꼭 가야지’ 하는 유명 전시들이 존재한다. 그런 곳들도 물론 놓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동시대적인 예술가에게 집중하고 싶었다. 그중 강한 여운을 남긴 작가는 2024년 오스트리아 <트렌드 매거진>에서 ‘40세 이하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 1위로 선정한 아누크 람 아누크(Anouk Lamm Anouk)였다. 그녀는 ‘No Age, No Gender, No Origin’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어떤 기준이나 경계도 두지 않겠다는 태도를, 회화와 드로잉, 조각, 설치, 글쓰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냈다. 그중에서도 그녀의 설치작품 ‘MOTHER N°1’은 긍정적인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인간과 돼지의 조건을 나란히 놓고 생명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선택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사실 비엔나에 오기 전까지 음식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다. 비행기에서도 입맛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비엔나의 식당은 어느 곳을 가든, 내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으며 그런 예상을 무너뜨렸다. 특히 기억에 남는 두 곳이 있다. 하나는 이탈리아 요리와 일식의 퓨전 레스토랑 쿠치나 이타메스히(Cucina Itameshi). 이탈리아 본연의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사시미를 비롯한 우동 면으로 만든 파스타 등 동양적 감각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요리들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또 하나는 비엔나 지역민이 찾는 트셰스니에프스키(Trzesniewski). 다양한 풍미의 스프레드를 얹은 오픈 샌드위치에 손바닥만 한 작은 맥주 ‘피프(Pfiff)’ 한 잔을 곁들이면 비로소 이 도시의 일상이 입안으로 담기는 듯하다.
비엔나의 아름다움을 하나라도 더 오래 눈에 눌러 담고 싶어 내리 며칠을 아주 바쁘게 걸었다. 신호등의 초록불이 깜빡이면 저 멀리서부터 뛰어갔고 폐점 시간이 될 때쯤 세 군데 매장을 10분 만에 도장 깨듯 훑기도 했다. 여느 때처럼 빠르게 걷던 세 번째 날, 기이한 점을 느꼈다. 이 도시에서 나만 유일하게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 도시의 사람들은 오롯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자신들의 리듬에 맞춰나가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도 비엔나의 기억은 내 안에서 조용히 살아 숨 쉴 것이다. 그 좋았던 순간들을 곱씹으며, 아마 오래도록 나를 채울 것이다.
<아레나옴므플러스>의 모든 기사의 사진과 텍스트는 상업적인 용도로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걸거나 SNS 퍼가기 버튼으로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