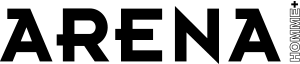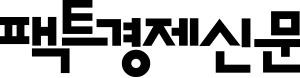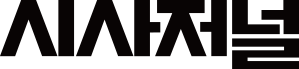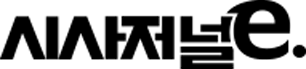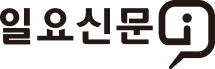간섭자
패션지 편집장을 하나의 이미지로 고착시킨, 악마 어쩌고 그 영화에 진짜 악마 한 마리가 들어 있었을지 모른다. 그 악마는 물기 하나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다. 내가 유행이라면 유행인 거야. 내가 유행할 거라고 콕 찍으면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야. 한 잡지가 혹은 한 편집장이 패션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스멀스멀 각인되긴 했다. 그게 그 나라의 유명 잡지 편집장에겐 가당한 상황이라는 걸 부인하지는 않으련다. 이 땅의 잡지에게도 비슷한 접점(강도가 많이 다르지만)이 있다는 것도.
한때 홍보용 제품을 마구 뿌려대던 한 휴대폰 업체에서 “이거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들고 다니시는 것만으로도 홍보가 될 거라고 믿어요” 했다. 고마운 말이다. 고마워서 손에서 놓지 않고 엄청 써댔다. 나 말고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전달받은 걸까? 곧 청담동 일대를 그 제품이 접수했다. 마케팅적으로 말하자면 모방 효과가 먹힌 거다. 자주 보면 갖고 싶다는 심리 역시 반박할 여지는 없다.
이 바닥 생리가 그렇다. 이 바닥이라 하면 패션지를 포함한 그 언저리. 일반적 소비 행태의 두 가지 효과가 혼재돼 있다. 시끄러운 모방 효과라 부르는 ‘밴드 왜건(Band Wagon Effect)’과 독야청청 백로 효과라 부르는 ‘스놉 효과(Snop Effect)’ 말이다. 밴드 왜건은 ‘네가 입으니까, 나도 입어’ 하는 거고 스놉 효과는 ‘난 너랑 달라, 난 네 건 안 입어’ 그러는 거다. 그런데 이 바닥 사람들은 스놉을 거쳐 밴드 왜건으로 간다. 다시 말하자면 남과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을 ‘모방’한다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잡지만큼 남과 ‘다른’ 취향을 가진 인물들을 집대성해놓은 매체도 드물다. 사람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밥 먹으러 가는 곳, 밥 떠 넣는 수저, 밥 담는 그릇까지 다른 안목과 취향을 설파한다. 그러면서 따라 하게 한다. 너와 나는 동지야, 얼른 따라와… 속삭인다. 산업 마케팅적 측면에서 이런 효과를 잘 이용하면 ‘특화 소비계층’을 만들 수 있다. 그게 매력이긴 하다. 그런데 이 특화 소비계층은 호불호가 강하다. 소비 강성체다. 수틀리면 바로 버린다. 서두에 설명했던 그 휴대폰도 2년 후 바로 버림받았다. 디자인은 그럴듯한데, 기능이 따라주질 않았다. 게다가 무쇠 팔 무쇠 다리가 유행이라고 모두 마징가 제트 철갑을 두르지는 않는다. 무쇠팔 한 쪽에 무쇠 다리 한 쪽, 이런 식으로 스페셜 오더 진검승부를 벌인다. 그걸 우리는 ‘까다롭다’라는 단어로 총칭한다. 까다로움, 그 긍정적인 궁극은 취향의 확고함이다.
그리고 그 취향의 확고함을 취재하는 것이 잡지의 몫이다. 삼단 논법에 의거, 잡지야말로 까다로움의 총체가 되는 것인가. 하하. 대한민국 잡지 인생 40여 년 동안 그 까다로움이 잡지 콘텐츠를 지탱해왔을 것이다. 물론 이건 오만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까다로움의 전달 과정에 간섭자가 생겼다. 광고주다. 유명 브랜드의 제품은 훌륭하다. 트렌드를 제시하는 데 도가 텄다. 돈도 많고 힘도 세다. 이거야 뭐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그렇게 힘센 광고주가 무지 많다. 백여 개다. 이들의 제품을 둘러보고 선별하고 그 까다로움을 전하는 것으로도 밤을 팬다. 지난 10년간 간섭자들의 힘은 점점 세졌다. 잡지는 유행 전달자다. 그들의 취향이 전 세계를 움직이니 그 유행을 전하는 데만도 빠듯했다. 하지만 가끔 허리를 곧추 펴고 발밑을 바라보면 힘은 없으나 취향은 확고한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다. 많다.
사실 유행할 게 빤한 걸 소개하는 건 재미없다. 특화 소비계층을 구축한다는 본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잡지에 소개해서 유행을 만든다, 가 좋겠다.
5월 10일 18시.
대한민국 패션 디자이너 연합회 발족식이 있었다. 고등학생들도 몇 년 치 세뱃돈 모아 맞춰 입고 갔다는(스타일리스트 정윤기와 김성일의 얘기다) 카루소의 디자이너 장광효 이하 수십 명의 남성복 디자이너를, 아니 여성복까지 합치면 무려 1백30명이나 되는 디자이너를 만났다. 아니 봤다. 많이 몰랐다. 그날 16개 패션지의 편집장들은 패션 디자이너 연합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촉장을 받았고 줄줄이 인사말을 했다. 열댓 개의 축하 인사가 지나고 난 자리에 기대의 박수가 채워졌다. 그날 협회장으로 선출된 디자이너 이상봉 이하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나를 봤다. 수백 개의 눈이 나를 봤다. 그건 약속 같았다. 무언의 압력 같기도 했다. 너희는 힘이 있잖아, 없어도 합치면 되잖아, 하는 것도 같았다. 그들의 기대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힘도 좀 있다. 간섭자 운운한 건 현실이지만 핑계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낸다. 운영의 어려움이 숙제로 남겠지만 대한민국 패션 디자이너 협회가 있어야 하는 건 맞다. 모두 다 참여할 수는 없었다 해도, 일단 참여한 모두는 한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 힘세진 그들이 나의 또 다른 간섭자가 된다 해도 말이다. 우린 친구 아이가.
.jpg)
<아레나옴므플러스>의 모든 기사의 사진과 텍스트는 상업적인 용도로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걸거나 SNS 퍼가기 버튼으로 공유해주세요.
KEYWORD.jpg)